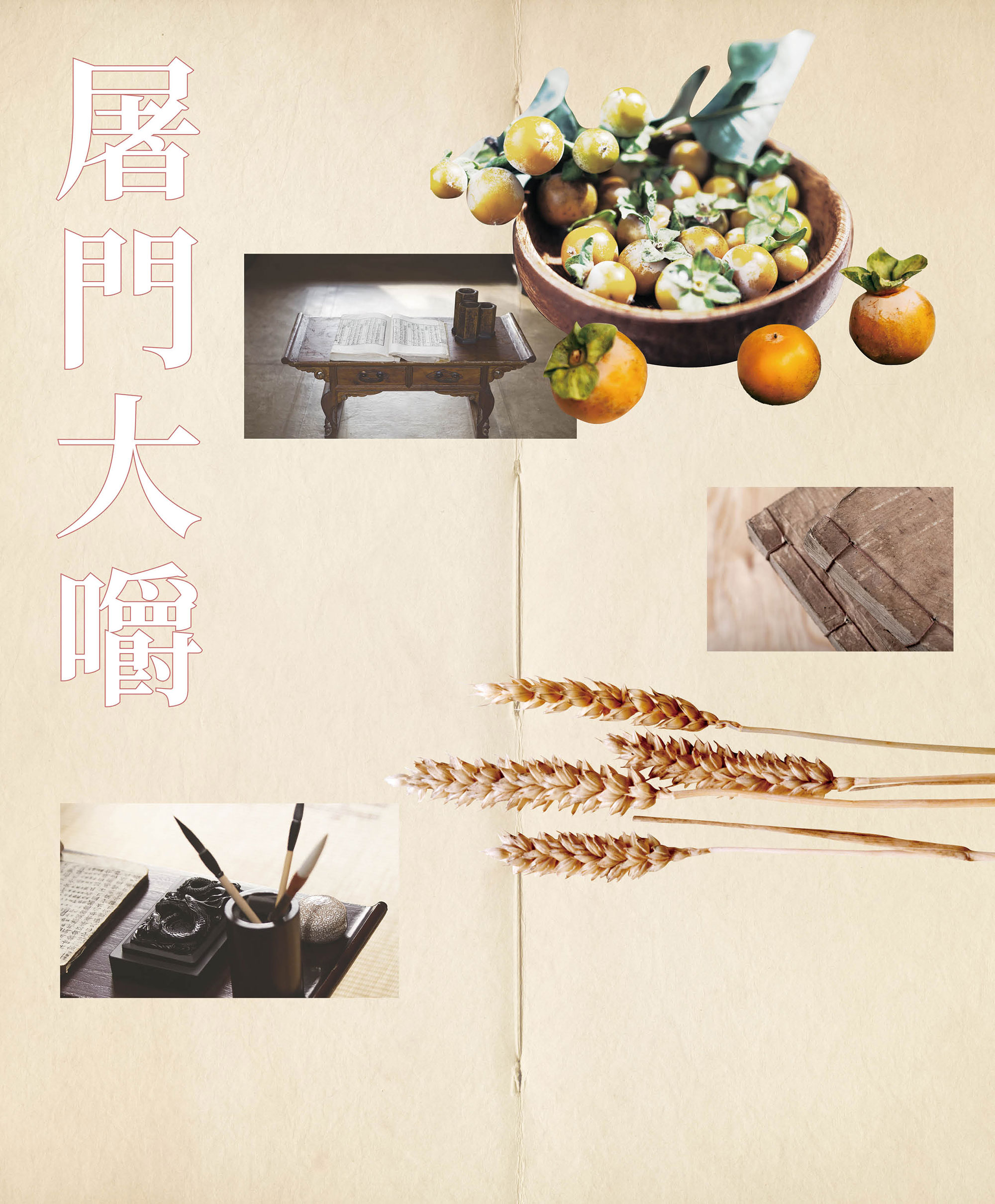글쓴이는 문헌 덕분에 먹고 산다. 이렇게 독자 여러분도 만난다. 한데 이런 자료에 영 고약한 구석이 있다. 문헌이란 무어냐? 읽어보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다면 문헌이란다. 그 내용을 놓고 안 읽은 사람과 읽은 사람이 다투다 읽은 사람이 안 읽은 사람한테 지는 게 문헌이란다. 마냥 웃을 수만도 없는 소리에다 허균(許筠, 1569~1618)의 〈도문대작(屠門大嚼)〉을 이어볼까 한다. 대중매체가 흔히 한국 역사상 ‘최초의 문자먹방’으로 이르는 이 문헌은, 그러나 그렇게 일도양단 할 수 없다. 그 서문 속의 한마디부터 만만찮다.
중세의 교양인이 미식을 탐하다
“식욕과 색욕은 본성이며, 더구나 식생활은 생존에 관련된다. 선현이 음식을 천하다고 할 때에는 먹기에만 빠져 저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다. 어찌 음식을 아예 제쳐 두고 입에 담지도 말라는 뜻이겠는가(食色性也, 而食尤軀命之關. 先賢以飮食爲賤者, 指其饕而徇利也, 何嘗廢食而不談乎)?”
이런 도발성은 ‘먹방’이 미칠 바가 아니다. 이러나저러나 이 글은 허균의 처지가 어렵고도 험할 때 쓰였다. 허균은 1610년 12월 조정의 결정에 따라 전라도 함열로 귀양살이를 떠났다. 그해 11월 내내 허균을 괴롭힌 별시(別試, 임시 과거 시험)의 부정 합격자 문제가 발단이었다. 허균은 그때 이항복(李恒福) 등 내로라하는 인물들과 함께 별시 관련 업무를 맡았는데 정치적 이해에 따른 잡음이 대단했다.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자 허균이 조카와 형의 사위를 부정 합격시켰다는 말이 나왔다. 정치적으로 적이 많았던 허균은 별수가 없었다. 한겨울에 귀양길에 오른 허균은 이듬해인 1611년 1월 15일 함열에 도착한다. 허균은 1612년까지 함열에서 지내며, 다 내려놓고 자신의 작품과 역대의 시문학사를 정리하는 데 애쓴다. 그 결과가 거대한 문집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이다. 〈도문대작〉이 그 속에 자리한다.
‘도문대작’은 중국 한나라 때 이미 있던 말이다. 유비(劉備), 손권(孫權)과 함께 천하를 다툰 조조(曹操)의 셋째 아들이자 위(魏)나라의 문장가 조식(曹植, 192~232)도 써먹었다. 조식은 “푸줏간을 지나며 크게 입 벌려 씹는 시늉을 함은, 비록 고기는 못 먹었어도 바로 이 순간이 소중하고 더구나 유쾌해서다(過屠門而大嚼, 雖不得肉, 貴且快意)”라고 했다. 조식의 시대에는 “고기 맛 좋은 줄 알면 푸줏간 문 앞에서 고기 씹는 시늉을 한다(知肉味美,則對屠門而大嚼)”라는 유행어도 있었다. 먹고 싶지만 형편이 안 되니 푸줏간에 걸린 고기라도 바라보며 질겅질겅 씹는 흉내나마 낸다, 그렇게 스스로를 잠깐 위로한다는 말이다. 궁색한 허균이 ‘좋았던 시절’을 얼마나 애타게 그렸는지 단박에 드러나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추억의 절반’은 ‘맛’ 아닌가! 하나 그걸로 다는 아닐 테다. 전쟁 전의 평화와 풍요를 향한 그리움은 전란 이후의 삶의 기획에 큰 울림을 준다. ‘전쟁 겪기 전에는 팔도가 무엇도 먹고 무엇도 먹으며 평화롭고 풍요로웠는데!’ 하는 문장은 전후의 복구를 촉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도문대작〉은 이런 점을 두루 염두에 두고서도 다시 읽어볼 만한 글이다.

조선팔도의 별미를 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담겼을까? 농학·민속학·조리학의 측면으로 본다면 이성우(李盛雨, 1928~1992)의 해제가 마침맞다. 그 해제에 따르면, 〈도문대작〉은 “허균이 우리나라 팔도의 토산품과 별미음식을 소개한 개설서”로 “특히, 허균 자신이 직접 그곳을 찾고 음식을 맛본 것”의 기록이기에 “간략한 해설이지만 식품과 음식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더욱이 별미음식이 넓은 지역에 걸쳐 선정되어 있으므로 당시, 상류계층의 식생활과 향토의 명물을 일별”할 수 있고, “17세기의 우리나라 별미음식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그러면서 군데군데 기록의 본격성이 상당하다.
‘석이병(石茸餅)’ 항목을 보자.
“내가 풍악(楓岳, 가을 금강산)에 갔다가 표훈사(表訓寺)에서 자게 되었다. 주지가 차린 저녁상에 떡 한 그릇이 놓여 있었는데 이 떡은 귀리[瞿麥]를 빻아 체에 여러 번 쳐 고운 가루를 받은 뒤, 꿀물을 넣어 석이와 반죽하여 놋쇠시루에찐 것이었다. 맛이 정말 좋아 경단[瓊糕]이나 곶감찰떡[糯柹餠]보다도 훨씬 낫다.”
화려한 떡만 볼 게 아니다. 쌀밥과 멥쌀떡 또는 찹쌀떡은 모두가 바라던 바이지만, 모두에게 허락되는 자원은 아니었다. 북쪽에서는 귀리를 귀하게 썼다. 쌀이 모자라는 지역 또는 계급은 보리, 조, 귀리, 메밀을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왔다. 바로 이런 모습의 구체성이 담긴 문서가 〈도문대작〉이다. 또는 천사리(天賜梨)·금색리(金色梨)·현리(玄梨)·홍리(紅梨)·대숙리(大熟梨)에 이르는 배 이야기도, 금귤(金橘)·감귤(甘橘)·청귤(靑橘)·유감(柚柑)·감자(柑子)·유자(柚子)·감류(甘榴)에 이르는 감귤류 이야기도, 조홍시(早紅柹)·각시(角柹)·먹감[烏柹]에 이르는 감 이야기도 이 자체로 소중하다. 이름과 함께 특징과 지역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기록은 한반도 농업과 작물의 연대기, 야생종과 재배종의 관계, 무엇은 그냥 두고 채집하며 무엇은 밭 또는 산림에서 관리하다 오늘날에 이르렀느냐 하는 질문과 직결된다. 가령 1893년 일본열도에서 발견·육성된 뒤 한반도로 들어온 배인 장십랑(長十郎, チョウジュウロウ)이며, 1930년대에 일본에서 도입되어 오늘날까지도 널리 재배하고 있는 신고(新高, にいたか)가 들어오기 이전의 한반도 배의 연대기에 파고든다면 그저 ‘배[梨]’만 쫓아다닐 수는 없다. 전근대 배의 연대기를 재구성하자면 문배, 돌배, 산돌배와 같은 품종과 어휘를 열쇠말로 쥐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도문대작〉 또한 펼쳐야 하는 것이다.
미래 자원으로서 그 중요도가 나날이 커가는, 해조류[海藻類, 바닷말] 및 해초류(海草類)를 돌아볼 때에도 그렇다. 이를 둘러싼 한문 기록, 한자 표현도 난삽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다. 가령 옛사람들이 무엇을 가리켜 ‘곤포’, ‘다시마’, ‘사마’, ‘다사마’라고 했는지는 잘 모른다. 한반도 해역 수중식물의 역사적 변천도 복잡할 테다. 단편적이라고 해도, 17세기의 해조류 및 해초류를 〈도문대작〉만큼 기록한 경우는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도문대작〉은 ‘문자먹방’이 아니다.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및 전근대와 현대의 자원과 식료품과 음식의 역사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기록이다. 팔도 방방곡곡, 전근대 상하귀천의 먹을거리의 전체를 따진다면 그야말로 소략해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겠지만, 한 문헌이 태어난 시대와 그 행간을 오늘날에 이어 읽으며 새로이 독해하기는 오늘날 사람들의 몫이다. 그만한 성의가 있을 때에만 물려받은 유산을 내일에 물려줄 수 있을 테다. ‘대먹방시대’는 곧 ‘대관종시대’이기도 하다. ‘먹고 싶지?’ ‘먹고 싶어!’로 다가 아닌 일상생활이 있고 내력이 있고 문화유산이 있다. 문헌 앞에서, ‘먹방질’과 ‘관종질’로는 이루 다 못할 일이 있음도 깨달아야 한다. 올해는 이런 말씀을 독자 여러분께 더 자주 하리란 결심을 하고 있다.
| 분류 | 먹을거리 또는 음식 이름 |
|---|---|
| 餠餌之類(병이지류) 죽/떡/과자를 아우른 분류 | 방풍죽(防風粥), 석이병(石茸餅, 떡 자체의 주재료는 귀리[瞿麥]가루), 백산자(白散子), 다식(茶食), 밤다식[栗茶食], 차수(叉手, 미상), 엿[飴], 대만두(大饅頭), 두부(豆腐), 웅지정과(熊脂正果), 둘죽(㐙粥, 들쭉죽). |
| 果實之類(과실지류) 과일과 과채를 아우른 분류 | 천사리(天賜梨), 금색리(金色梨), 현리(玄梨), 홍리(紅梨), 대숙리(大熟梨), 금귤(金橘), 감귤(甘橘), 청귤(靑橘), 유감(柚柑), 감자(柑子), 유자(柚子), 감류(甘榴), 조홍시(早紅柹), 각시(角柹), 먹감[烏柹], 밤[栗], 죽실(竹實), 대추[大棗], 앵두[櫻桃], 살구[唐杏], 자두[紫桃], 황도(黃桃), 녹이(綠李, 오얏), 반도(盤桃), 승도(僧桃), 포도(蒲桃), 수박[西瓜], 참외[甛瓜], 모과[木瓜], 달복분(達覆盆). |
| 飛走之類(비주지류) 날짐승과 네발짐승의 고기 |
웅장(熊掌), 표태(豹胎), 녹설(鹿舌), 녹미(鹿尾), 꿩[膏雉], 거위[鵝]. * 돼지[猪], 노루[麞], 꿩[雉], 닭[鷄]에 대해서는 “대체로 토산인 돼지, 노루, 꿩, 닭 등은 어느 곳이나 있기 때문에 번잡하게 다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부기. |
| 海水族之類(해수족지류) 동물성 수산물 |
숭어[水魚], 붕어[鯽魚], 위어(葦魚), 뱅어[白魚], 황석어(黃石魚), 오징어[烏賊魚], 해양(海䑋, 해파리?), 죽합(竹蛤), 소라(小螺), 청어(靑魚), 대전복[大鰒魚], 꽃전복[花鰒], 홍합(紅蛤), 해삼(海蔘), 은어[銀口魚], 열목어[餘項魚], 금린어(錦鱗魚), 누치[訥魚], 궐어(鱖魚), 복어[河豚], 방어(魴魚), 연어(鰱魚), 송어(松魚), 황어(黃魚), 가자미[鰈魚], 광어(廣魚), 대구어(大口魚), 문어[八帶魚], 정어(丁魚), 도루묵[銀魚], 고등어[古刀魚], 미어(微魚), 제곡(齊穀), 살조개[江瑤柱], 자합(紫蛤), 게[蟹], 동해(凍蟹), 석화(石花), 윤화(輪花), 대하(大蝦), 곤쟁이[紫蝦], 도하(桃蝦) * 민어(民魚)·조기[石首魚]·밴댕이[蘇魚]·낙지[絡締]·준치[眞魚]·병어(甁魚)·변종(變宗, 宗魚?)에 대해서는 “서해 곳곳에서 나는데 모두 맛이 좋아 다 기록하지 않는다. 병어(甁魚)와 변종(變宗) 등 물고기는 맛이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어 따로 쓰지 않는다”라고 부기. |
| 蔬菜之類(소채지류) 채소, 해조, 해초, 나물, 장아찌, 절임, 김치, 버섯을 포괄 |
죽순해(竹筍醢), 원추리[黃花菜], 순채[蓴], 파래[石蓴?], 무[蘿葍], 개자리[苜蓿?], 표고(蔈古), 홍채(葒菜), 황각(黃角), 청각(靑角), 참가사리[細毛], 우무[牛毛], 초시(椒豉), 삼포(蔘脯), 여뀌[蓼], 동아[冬瓜], 산갓[山芥菹], 곤포(昆布?), 조곽(早藿), 감태(甘苔), 해의(海衣), 토란[芋], 생강[薑], 겨자[芥], 파[蔥], 마늘[蒜]. * 고사리[蕨薇]·콩잎[藿]·아욱[葵]·염교[薤]·미나리[芹]·배추[菘朮]·송이[松蕈]·참버섯[眞菌]에 대해서는 “어디서 나든 다 맛이 좋으니 따로 쓰지 않는다”라고 부기. ‘곤포’ 항목에 다사마[士麻]와 미역[大藿]을 언급하고 ‘다시마’와 ‘다시마’를 구분. 가지[茄]·오이[瓜]·박[匏蘆]에 대해서는 “어디서나 나며 맛도 좋다”라고 부기. 부추[韭]·달래[小蒜]·고수[荽]에 대해서는 “모두 좋다”라고 부기. |
| 其他(기타) 서울의 절식, 차라든지 꿀과 같은 귀한 식료품 그리고 사치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과자를 포괄 |
차[茶], 술[酒], 꿀[蜂蜜], 참기름[油], 약밥[藥飯]. * 서울의 절식(節食): 쑥떡[艾糕], 송편[松餠], 느티떡[槐葉餠], 두견화전(杜鵑花煎), 이화전(梨花煎) 이상 봄/장미전(薔薇煎), 수단(水團), 쌍화(雙花), 만두(饅頭) 이상 여름/경단[瓊糕], 국화병(菊花餠), 곶감밤찹쌀떡[柹栗糯餠] 이상 가을/떡국[湯餠] 이상 겨울/자병(煮餠), 증병(蒸餠), 절병(節餠), 월병(月餠), 삼병(蔘餠), 송고유(松膏油), 밀병(蜜餠), 설병(舌餠) 이상 사계절. ** 제례와 빈객을 위한 유밀과[蜜餠]: 약과(藥果), 대계(大桂), 중박계(中朴桂), 홍백산자(紅白散子), 빙과(氷果), 과과(瓜果), 봉접과(蜂蝶果), 만두과(饅頭果). *** 물반죽 압출면인 ‘사면(絲麪)’을 따로 기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