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손한 표현 넓고 깊은 세계
조선 숙종의 어의(御醫)를 지낸 이시필(李時弼, 1657-1724)이 쓴 백과전서 성격의 책 〈소문사설(謏聞事說)〉 속의 한 대목이다. 토란국 익숙하고, 토란조림, 토란전 하는 집도 봤지만 토란으로 병과(餠菓) 만들기는 처음 본다. 다 까서 씻어 파는 놈 말고 흙 묻은 잘생긴 놈 골라다가 만들어라! 하고 주석까지 붙였으니, 이시필은 재료부터 잘 아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뚜껑 닫아라, 토란 껍질 잘 벗겨라 하는 조언을 보니 평소에 내 손으로 음식을 해 본 사람이 쓴 글인 줄을 익히 알겠다.
‘소문사설’, ‘고루하고 견문이 좁은 내가, 보고 들은 이야기를 기록하다’라는 뜻이다. 겸손하게 말했지만 이시필은 나라의 일을 하느라 청나라를 오간 인물이다. 청나라 제2의 수도인 심양에서는 심양 계엄사령관의 집에 왕진한 적도 있다. 이시필은 백두산 조청 접경의 첩보에도 예민하게 굴었다.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동래(東萊)까지 발품을 들여 다녀오기도 했다. 조선에서 카스텔라 또는 스펀지케이크를 구워보겠다고 궁중에서 팔을 걷어붙인 적도 있다.3) 남 못잖은 견문에, 먼저 먹을거리로 사람을 살린다는 관념이 있던 시대의 의관으로서의 경험에,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발품을 아끼지 않은 성품까지 해서, 이시필은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4)을 망라한 책을 쓸 만한 인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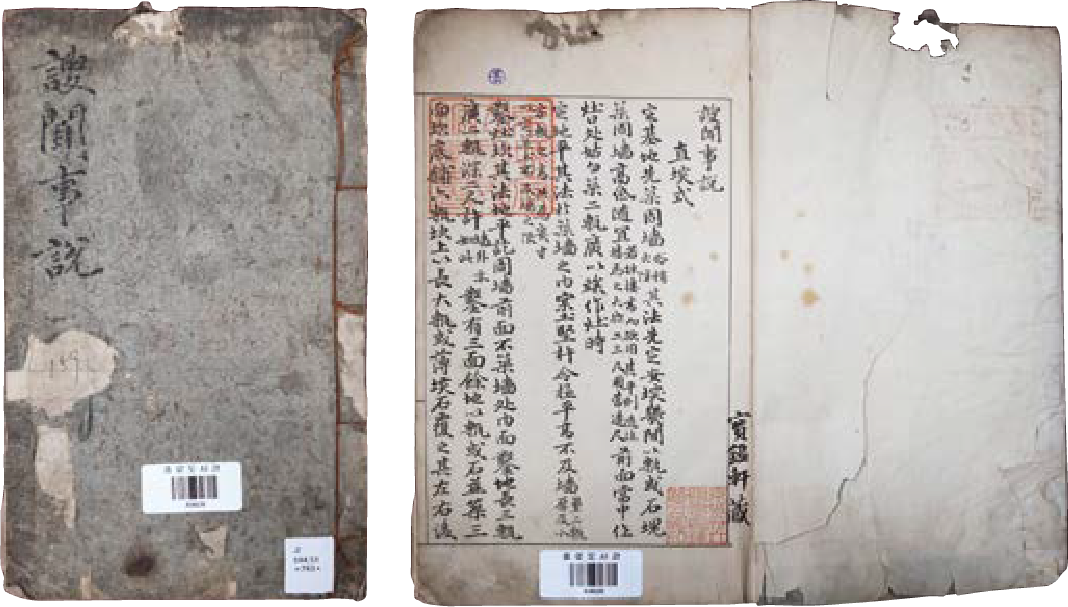
백과사전 속에 자리한 음식
백과전서 성격이니 그 내용이 음식으로 다는 아니다. 온돌의 기술론, 산업기술에 필요한 도구, 음식과 조리법, 기술의 실제 활용, 이상 4부 구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생생한 데가 음식과 조리법을 다룬 데다. 의관으로서 음식에 해박했고, 실제로 아픈 숙종을 위해 직접 별식을 만들어본 사람의 저술 아닌가. 토란떡 외에 표제어로 오른 음식은 동아찜·송이찜·메밀떡·더덕떡·붕어구이·붕어찜·닭고기만두·굴만두·만두전골·꿩장·함전복(餡全鰒)·마늘장아찌·연백당(軟白糖)·낙설(酪屑)·새끼돼지찜·주악·계란탕·돼지대창볶음·녹말국수·열구자탕(悅口子湯, 신선로)·연근녹말죽·서국미(西國米)·붕어죽·두부피·대구속찜·밀가루새알심·귀리송편·까치콩채·오이장아찌· 즙장·개성식 식혜·순창고추장·식혜·깍두기·백어탕(白魚湯)·가마보코(可麻甫串)·배추찜에 이른다. 도구와 기술을 다룬 장에서는 식용유 착유·제면용 누룩·타락죽·두부·엿·홍합·오리알·양고기 삶기·조기·준치·붕어·오징어·가오리 등도 언급했다.

오늘날의 눈으로 보아도
음식 몇 가지를 살펴보자. ‘함전복’은 어떤 음식일까? 반건조 전복의 속에 잣으로 반죽한 소를 채워 만드는 별식이다. ‘연백당’은 정제당으로 만든 고급 사탕이다. 이시필은 이 연백당을 심양의 계엄사령관 송주(宋柱)의 집에 왕진한 데 대한 사례로 연 잔치 자리에서 맛보았다. 이때가 대략 1710년쯤이다. 그 맛과 감촉은? “과연 최고의 맛이었다. 입속에서 조각조각 잘고도 가볍게 부서져 아예 씹을 것도 없었다. 게다가 이에 붙지도 않았다.”5) 우리가 흔히 사탕이라고 이르는 제과의 체계는 크게 두 갈래를 이룬다. 하나는 입속에서 얌전히 녹여 먹는 갈래이다. 다른 하나는 통쾌하게 씹어 먹는 갈래이다. 씹어 먹으라는 설계라면? 위에 보이는 연백당과 같은 미덕이 있어야 한다. ‘낙설’은 동물의 유지(乳脂)를 말려 받은 가루를 설탕과 섞어 만든 가루 과자이다. 중식 ‘계란탕’을 설명하면서는 조선 사람들에게 낯선 돼지기름[lard]의 담박함을 예찬하기도 했다. 좋은 지방은 느끼하지 않다. 내 관능을 활짝 연 사람 아니면 못 이룰 기록이다. ‘서국미’는 무엇일까? 사고야자 등에서 받은 녹말, 사고(sago)를 말한다. 또는 동남아시아산 녹말을 두루 일컫기도 한다. 그 녹말로 알갱이처럼 만든 먹을거리를 한자로 서국미 등으로 표기했다. 이시필은 실제로 아픈 누이를 위해 동래로 가 서국미를 구해왔다. 당시 동래는 왜관을 통해 들어온 동남아시아 물산이 꽤 유통되었다. 이시필은 서국미를 설탕물을 더해 죽을 쑤었다. 밀크티의 녹말 알갱이를 되게 쑤어 따듯하게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쉽다. 이는 오늘날 중국 광둥 및 남중국해권에서 여전히 인기가 높은 방식이기도 하다. ‘가마보코’는? 이 책의 가마보코는 생선·해삼·고기·버섯 등을 두루마리처럼 말아, 녹말가루 입혀, 끓는 물에 익힌 음식이다. 그런데 그 말만큼은 일식 어묵인 ‘가마보코(蒲鉾)’와 딱 맞아떨어진다. 전근대 한일 음식 교류의 흔적일 테다.
툭 터진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담다
이시필은 일상생활에 요긴한 사물을 기록한 사람이다. 먹는 데서는 툭 터진 마음으로, 내 관능까지 아울렀다. 덕분에 특히 음식과 조리 부분에서 보면 볼수록 흥미진진한 기록이 남았다. 가령 이시필이 남긴 순창고추장은 오늘날의 순창고추장과는 다르다. 이 책 속의 순창고추장은 일반적인 고추장을 넘는, 보다 본격적이면서 적극적인 별미장의 면모를 담고 있다. 이시필이 옛 농업경영서가 담을 만한 일반적인 장의 기록을 답습했다면, 답습하는 쯤의 좁은 시야에 갇혀 있었다면 이상과 같은 기록은 불가능했을 테다. 사물의 실제를 예민한 사람, 내 손으로 사물을 다루어 본 사람, 지식과 정보와 일상생활을 아우르는 감각이 있는 사람의 기록은 다르다. 혼자 보기 아깝다. 독자 여러분과 이렇게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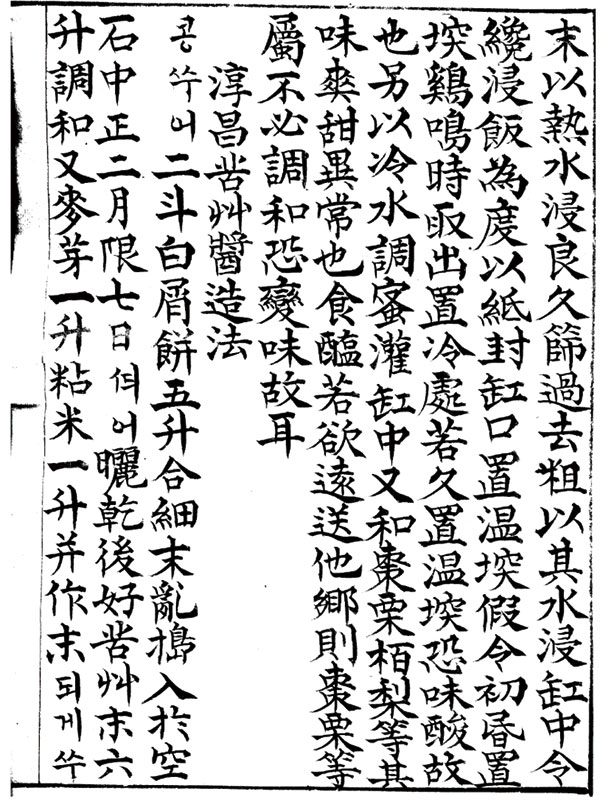

- 원문은 ‘不爛’이다. 문맥상 수확한 뒤에 가장 먹기 좋은 상태가 되는 ‘후숙(後熟)’에 잇닿아 있는 표현이다.
- 원문은 ‘急洗淨’이다. 조물대지 말고 재빨리, 그러나 말끔하게 씻어내라는 말이다. 재료가 손을 너무 많이 타고, 물이 필 요 이상으로 많이 닿으면 조직이 상하고 이취가 올라오게 마련이다.
- 인터넷에는 이시필이 조선 숙종 때 카스텔라를 구워 숙종이 그 카스텔라를 먹었다는 낭설이 돌아다닌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시필이 카스텔라 또는 스폰지케이크 굽기를 시도는 했다. 하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숙종도 이시필이 구운 서양식 과자를 먹어 본 적이 없다.
- 이시필 지음, 백승호/부유섭/장유승 옮김, 〈소문사설, 조선의 실용지식 연구노트〉, 휴머니스트, 2011.
- 이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果絶味也. 入口片片飛, 少無勞齒, 且不黏牙.” 같은 시대 온 지구를 통틀어, 사탕에 대한 이만한 관능 표현이 별로 없을 테다. 제과 교과서가 수습할 만한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