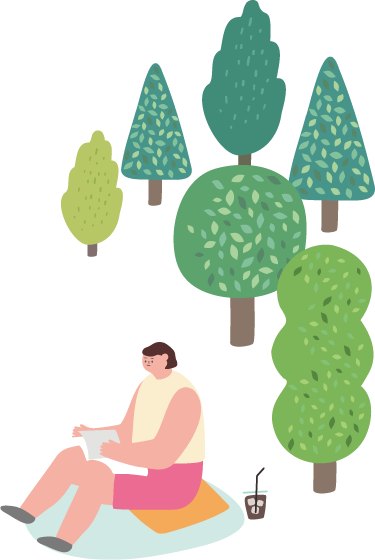사람과 자연을 연결하는 사람, 연결사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 조경설계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온 인물, 정영선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는 그녀의 경력을 조명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녀가 그려온 ‘땅 위의 기억’과 ‘시간을 이식하는 작업’, 그리고 ‘마음을 정착시키는 풍경’에 관한 이야기도 담고 있다.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풍경, 자연의 이치, 그리고 조경에 대한 그녀의 철학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았다.
그녀가 조성한 공원은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만한 공간들이다. 선유도공원,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경춘선숲길,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제주 오설록 티뮤지엄 등 모두 그녀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국가적 대형 프로젝트부터 개인의 정원까지, 방대한 영역을 망라하며 그녀는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는 작업을 꾸준히 추구해 왔다. 그래서 정영선은 자신을 “가능한 우리 환경에 잘 적응하고, 우리 것의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잘 끌어들이고, 잘 되새기고,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해서 그다음 세대와 잘 연결하는 사람”이라 소개하며 스스로를 ‘연결사’라 말한다.
정영선이 공간을 조성할 때 지키는 원칙이 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소박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전통 미학에 근거해 땅이 간직한 고유의 아름다움을 거스르지 않으며, 마치 시를 짓듯 그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영화는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 자연이 보여주는 섬세한 변주를 차분히 따라간다. 봄에는 꽃이 가득 피어오르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우거지며, 가을이면 붉은 단풍이 물들고, 겨울이면 고요한 숨결이 풍경을 감싼다. 특히 장면마다 계절을 수놓는 다채로운 식물들이 등장하는데, 화면에는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주듯 정성스레 담아낸다.

풀이라든가 흙이라든가 한 포기의 꽃이라든가 나무 한 그루, 새, 나비 등 모든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정신을 길러주고자 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기억을 담은 풍경
그녀가 만든 공원에는, 단지 풍경만이 아니라 그곳에 스며든 ‘이야기’가 있다. 도심 한복판, 청둥오리가 노닐고 억새가 우거진 강변, 큼지막한 버드나무가 자리한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지금은 많은 시민이 사랑하는 공간이지만, 조성 당시만 해도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 ‘개발을 하랬더니 왜 풀만 심고 있냐’는 공무원의 삿대질 속에서도 그녀는 굽히지 않았다. ‘죽어도 샛강을 살려야겠다’라는 신념 하나로 밀어붙였고 이후 그곳은 수달, 황조롱이, 수리부엉이 같은 귀한 생명들이 찾는 공간이 됐다. 경춘선 숲길도 마찬가지다. 기찻길 주변으로는 주민이 저마다 가꿔 놓은 작은 텃밭이 있었다. 텃밭을 철거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그녀는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지켜냈다. 주민들의 손길이 머물던 흔적을 존중해 텃밭을 보존하며 숲길과 어우러지도록 했다.
가장 극적인 사례는 아산병원 숲의 나무 그늘일지도 모른다. 환자가 울 수 있는 공간, 보호자가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주차장 위’ 믿기 힘든 공간을 만들었다.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자라고, 사람들이 조용히 울다가 쉬어 갈 수 있는 공간. 정영선은 말한다. 조경은 단지 꽃과 나무를 심는 작업이 아니라고. 공간에 오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인간과 자연이 진정으로 어우러질 수 있다고 그는 믿는다.
〈땅에 쓰는 시〉는 제목 그대로 땅 위에 ‘시’를 새기는 다큐멘터리다. 그리고 정영선이라는 인물에게 바치는 헌사이기도 하다. 펜 대신 손으로, 삽으로, 때로는 마음으로 써 내려간 그녀의 땅 위에 쓴 시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묻게 된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공간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이어가야 할까. 그리고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야 할까. 정영선이 땅에 새긴 시구(詩句) 같은 풍경을 따라가 보자. 자연스레 그 정답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풍경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과거 여의도 샛강이 자리한 곳은 밤섬과 여의도 사이에 한강 물이 쌓여 형성된 거대한 삼각주로, 다양한 생명이 살아 숨 쉬던 공간이었다. 하지만 1968년 여의도 한강 개발 계획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토목 공사가 이뤄졌고, 샛강은 도시 배수를 위한 인공 하천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런 가운데 1996년, 한강관리사업소 자문위원을 맡고 있던 정영선과 샛강의 인연이 시작된다. 샛강을 주차장과 운동장으로 만들겠다는 한강관리사업소의 계획안을 본 정영선은 소장을 직접 샛강으로 데려가 김수영 시인의 <풀>을 읽어준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작고 연약한 풀이, 시멘트 아래에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고 정영선은 수생식물학자, 곤충학자, 물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 샛강을 물고기와 식물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유일무이한 도심 속 습지로 탈바꿈시켰다.
다큐멘터리에서 정영선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버드나무가 너무 예쁘게 자라고, 억새도 진짜 예쁘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죽어도 살려야겠다’ 싶었죠. 공사 한창 하고 있는데, 동네 주민들이 매일 내려와서 빵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고 자연스러운 정원을 만들어줘서 고맙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주민들은 다 좋아했어요.”
무엇보다 이곳은 한강 유일의 습지로 버드나무, 갈대, 억새 등이 군락을 이루는 도심 속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다. 서울 한복판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온갖 야생화를 비롯해 버들치, 송사리, 붕어까지 다양한 생물이 살아 숨 쉰다. 주민은 물론 직장인들도 즐길 수 있도록 약 6km 길이의 산책로가 조성돼 있으며, 최근에는 흙길 산책로가 마련돼 맨발로 걷는 사람도 늘고 있다.
-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9





정수장에서 아름다운 친환경 생태 공원으로
선유도공원
선유도공원은 정영선의 대표작 중 하나다. 한강에 자리한 섬, 선유도의 옛 정수장 시설을 활용해 조성한 국내 최초 생태공원으로 2002년 문을 열었다. 정영선은 건축가와 함께 이 공간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대신, 버려진 시설 일부를 재활용해 생태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수조 안에 남아 있던 콘크리트 기둥은 덩굴식물로 뒤덮여, 어느새 나무 기둥처럼 풍성한 생명의 구조물로 변신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울고 싶더라, 너무 좋아서. 정수 공장을 한 바퀴 다 보고 난 다음에 풀밭에 앉아 가지고 말했어요. 봐라 여기가 겸재 정선이 한강 풍경을 그리던 그 섬의 일부다. 팔당 저 위에서부터 마포 아래까지, 한양 8경을 그리던 그 강줄기다. 이 풍경을 꼭 살려야 한다. 정수시설이 있더라도, 그 시절의 기억과 함께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절대로, 부순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그 결과 정수장 폐허는 야생식물로 덮여 거칠면서도 생명력 있는 풍경을 자아냈고, 선유도 공원은 시간이 남긴 흔적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그 아름다운 모습 덕분에, 최근에는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등극하기도 했다. 공간은 이야기관, 녹색기둥의 정원, 수질정화원, 네 개의 원형 공간, 선유교전망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 주소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343